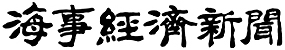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진짜 ‘공영화’가 시작되려면
민간위판의 종언인가, 수산 유통의 새 기회인가
부산공동어시장이 바뀐다. 건물이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구조’가 바뀐다. 민간조합 중심의 위판장이, 이제는 법적 중앙도매시장으로 다시 태어난다. 수산물 유통 체계가 공영화의 문턱을 넘는다. 바로 이것이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에 2,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는다. 고작 낡은 위판장 하나 새로 짓자고 이런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다. 수산 유통 시스템의 공적 관리 기반을 다시 짜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들어간 사업이다.
수산물 유통은 그동안 '비공식성'과 '관행'에 많이 의존해왔다. 위판장의 수수료율은 때로는 제각각이었다. 위판금 대금 결제도 지연되기 일쑤였고, 물량 배정이나 등급 분류에 대한 투명성 논란도 적지 않았다. 이 모든 혼탁한 요소들이 ‘민간조합 중심의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되곤 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수산물도 공적 유통의 관리 대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되면, 도매업 종사자 등록, 대금 결제 방식, 수수료율 등 거의 모든 부분이 조례와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즉, 행정의 통제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물론 저항도 예상된다. 수익 분배의 자유로움을 누려온 일부 민간 조합원들은 공영화가 '자율권 박탈'로 느껴질 수도 있다. 기존 방식이 누군가에겐 더 편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산업의 미래는 그 ‘편의’ 위에 있지 않다. 물류는 투명해야 하고, 가격은 공정해야 하며, 신뢰는 시스템 위에 세워져야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의 시사점은 유통구조 개혁의 시험대라는 데 있다. 국산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유통의 낙후성, 수협과 위판장이 나누는 역할의 경계 불분명… 이 모든 구조적 모순은 단순히 어시장을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산공동어시장의 공영화는 그 해답을 실험할 ‘첫 무대’가 될 수 있다.
관건은 하나다.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울 ‘시스템’이다. 자동선별기, 피쉬펌프 같은 물리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위판과 정산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체계다. 감시받지 않는 시장은 언제나 왜곡되기 마련이다.
부산공동어시장은 반세기 동안 한국 수산물 유통의 중심이었다. 이제는 한국 수산물 유통의 혁신이 출발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이번 사업이 단순한 공사 완료가 아니라, 수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공영’이 단지 형식이 아닌 내용과 원칙의 문제로 구현돼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보다,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바뀔 때 시작된다. 그 변화의 첫 걸음을, 부산이 내디뎠다.